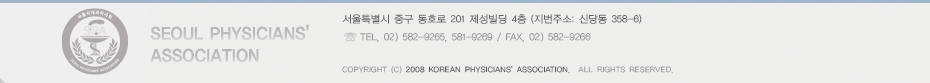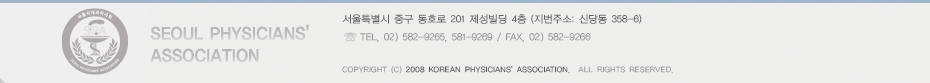김성근 감독이 신윤호를 처음 만난 것은 2001년 LG 2군 감독에 취임하면서였다. 그때만해도 신윤호는 LG에서 가장 속을 많이 썩이는 선수였다.
신윤호는 150km를 던질 수 있는 당시만해도 매우 드문 ‘파이어 볼러’였다. 그러나 신윤호는 만성적인 제구력 불안으로 수년째 유망주에만 머물러 있었다.
가장 답답한 것은 신윤호 본인이었다. 그는 어느새 술로 쓰린 속을 달래는데 익숙해졌다. 그리고 술을 이기지 못해 크고 작은 사건 사고의 주인공이 되곤 했다.
그러나 김 감독을 만난 신윤호는 전혀 다른 선수가 됐다. 2001년 김 감독이 1군 감독대행으로 올라오며 마무리를 맡게 됐고 1년동안 최고의 활약을 펼치며 3관왕(다승,구원,승률)을 차지했다. 그 비결은 바로 믿음이었다.
신윤호는 “다들 내게 “네 공은 한 가운데 던져도 못친다”거나 “맞아도 좋으니 정면승부를 하라”고 했다. 그러나 정작 맞으면 말을 바꿨다. 1군에 잠깐 올라갔다 미끄러지는 날들의 연속이었다. 언젠가부터 마운드에 서면 벤치를 쳐다보는 것이 버릇이 됐다. 그러나 김성근 감독님은 달랐다. 정말 맞아도 뭐라 안했다. 한번 무너져도 다음에 또 나를 위기 때 썼다. 마운드에 오를수록 자신감을 갖게 됐다. 공 하나 던지고 벤치 쳐다보던 버릇도 어느새 사라졌다”고 놀랄만한 변신의 이유를 설명했다.
물론 신윤호가 말썽을 일으키는 일도 사라졌다. 이후에도 술을 먹긴 했지만 가슴 속 응어리가 사라지니 술의 힘을 빌어 감정을 폭발 시킬 필요도 없었다.
신윤호는 아직 그때의 영광을 재현해내지 못하고 있지만 더 이상 방황하는 일은 없다. 믿음의 토대 위에 놓여진 2001년의 성공이 그의 정신을 한층 성숙시켰기 때문이다.
LG 포수 조인성은 말썽쟁이와는 거리가 먼 선수다. 순한 인상처럼 행동도 부드럽고 크게 어긋나는 행동도 하지 않는다. 그러나 김 감독 입장에선 조인성 역시 속 썩이는 선수 중 하나였다. 좋은 기량을 갖고 있으면서도 좀처럼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누가 따로 집계하지는 않았지만 조인성은 김 감독 재임기간 동안 가장 많이 혼이 난 선수로 선수들의 기억에 남아 있다.
조인성은 강한 어깨를 지니고 있는 대형 포수 유망주였지만 투수 리드에 있어선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다. 포수의 역할을 강조하는 김 감독 입장에선 그의 성장이 절실했고 그만큼 사랑의 매가 많이 가해졌다.
2군으로 떨어트려보기도 하고 지방 원정지에서 짐을 싸 서울로 보내버린 적도 있었다. 그러나 조인성은 눈에 띄게 나아지지 못했다.
그러던 어느날. 잠실에서 KIA와 경기를 하고 있었다. 김 감독은 경기 전 조인성에게 절대 서두르지 말 것을 지시했다. 당시 흐름상 점수를 좀 주더라도 후반부에 승부를 걸 수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5회초 LG 수비. LG는 1점차로 앞서 있었지만 투수의 제구력이 흔들리며 주자가 모였다. 위기였다. 김 감독은 마음 속으로 계산기를 두드렸다. ‘급한 건 저쪽이다. 무리해서 승부 하지 마라.’ 경기 전 조인성에게 주문했던 내용 그대로였다.
그러나 조인성은 김 감독의 마음과 정 반대로 리드를 펼쳤다. 스트라이크 잡으러 들어가기 급급하다 그만 결정타를 얻어맞고 말았다. 흐름은 KIA 쪽으로 넘어갔고 승부도 그걸로 끝이었다.
공수가 교대되자 김 감독은 조인성을 덕아웃 뒤로 불러세웠다. 그리고 큰 소리로 꾸짖기 시작했다. “이 돌대가리 같은 놈아. 언제까지 너 위주로 리드를 할거냐. 포수는 엄마처럼 투수를 감싸고 이해해야 한다고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들을 거냐.”
경기 중 흐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좀처럼 감독 의자에서 움직이지도 않는 김 감독이다. 그런 그가 경기 중에 그와 같은 일을 했다는 건 큰 사건이었다. 조인성의 자존심에도 큰 상처가 났을 터.
조인성은 속으로 홀로 생각했다. ‘오늘 또 짐 싸서 구리(2군 훈련장)로 가야겠구나…’ 그러나 그날도 그 다음날도 그에게 2군행 지시는 내려지지 않았다.
공개적으로 그리 크게 혼이 났으니 충분히 반성할 수 있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조인성이 누구보다 성실하게 훈련해 온 만큼 길도 찾아낼 수 있을거라 믿었던 것이다. 다음날 조인성의 이름은 2군행 선수 자리가 아닌 스타팅 라인업에 들어 있었다.
김 감독은 “정말 크게 혼을 냈을때 2군까지 내려 보내면 선수가 받는 충격이 훨씬 커질 수 밖에 없어. 잘되게 하려고 혼내는거지 내 화를 풀려고 내는게 아니니까. 그때 이후론 인성이를 더욱 중용했어. 결국은 해낼거라고 믿고 있었거든. 인성이도 보다 책임감을 갖고 잘 해줬고. 덕분에 한국시리즈까지도 갈 수 있었다고 생각해”라고 말했다.
김 감독과 조인성이 한 유니폼을 입었던 것은 2002년이 마지막이었다. 그러나 조인성은 여전히 때가 되면 김 감독을 찾아가 인사를 하고 있다. ‘미운 정이 쌓이면 고운 정보다 더 무섭다’는 말은 괜히 나온 것이 아닐지도 모른다.